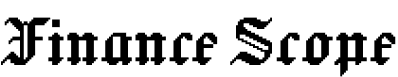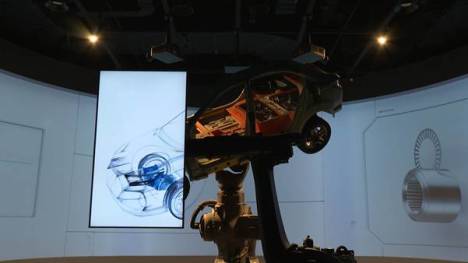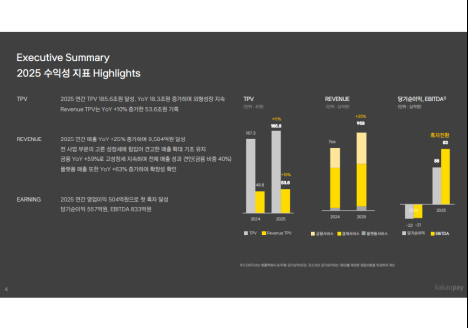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 동북아 경제 안보를 뒤흔드는 '중일 무역 전면전'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공식 통보한 데 이어,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인 화장품에 대한 제재까지 검토 중이라는 설까지 나오며 양국 관계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20일자 사설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에서 일본을 강하게 경고했다. 사설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어떤 형태의 타협이나 후퇴도 있을 수 없다”며 “일본이 끝내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적 행동을 지속한다면, 중국은 더욱 강경한 대응 조치를 취할 충분한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릴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일본이 부담하게 될 것이며, 그 희생은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이라며 “일본 우익이 만들어낸 허구적 ‘정치적 올바름’ 서사가 국가 이익보다 앞설 수 없고, 중·일 관계의 거시적 안정을 흔들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과 주니치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미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을 내렸으며, 일본 영화 상영을 잠정 중단하는 등 전방위적 '한일령(限日令)'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보복이 수산물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지에선 일본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검토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일본 화장품 수입액은 약 31억 7000만 달러로, 수산물 수입액(약 4000만 달러)의 약 80배에 달한다. 만약 화장품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시세이도 등 일본 뷰티 기업은 물론 관련 소재·부품 업계까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희토류 수출 규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관광보다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일본 산업계를 마비시킨 전례가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그동안 희토류의 탈중국화를 진행해온 만큼 앞으로 미칠 파장은 좀더 두고 지켜봐야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일본 화장품 외에도 산리오 캐릭터, 문구류, 카메라, 유니클로, 닌텐도 등 일본산 인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확산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중국 소비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의 입지가 급격히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국 외교 라인은 가동되고 있으나 갈등 봉합은 요원해 보인다.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중국 측 류진쑹 국장이 일본 측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가 포착되는 등 냉랭한 기류가 이어졌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중국 측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외교적 항의를 넘어 일본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일본 화장품과 소비재가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동북아 공급망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